(1) 1차 고려-거란 전쟁
993년(성종 12년) 10월 요나라의 동경유수 소손녕(蕭遜寧)이 고려를 침공한다.
993년 5월과 8월에 압록강 부근의 여진으로부터 거란이 고려를 침입할 것이라는 통고가 있었다.
10월에 거란의 소손녕이 고려를 침략하자 고려는 박양유(朴良柔)와 서희(徐熙) 등을 보내 막게 하였다.
성종도 친히 안북부까지 나아가 전선을 지휘하였는데 선봉장 윤서안이 사로잡히고 봉산군을 빼았긴다.
성종은 서경으로 돌아와 이몽전을 소손녕에게 보낸다.
소손녕은 고려의 항복을 요구한다.
이에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서 황주(黃州)부터 절령(岊嶺)까지 국경으로 삼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서희와 이지백(李知白) 등이 항전을 강력히 주장하여 성종의 결정을 이끌어 낸다.
소손녕은 안융진(安戎鎭) 공략에 실패한다.
고려는 이 기회를 노려 서희를 보내 소손령과 담판한다.
담판 내용을 통해 이 시기의 국경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후신이다. 그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한 것이다."
"요나라의 동경은 모두 고려 땅인데 어찌 우리가 침략해 차지했다고 하는가?"
"압록강 안팎은 우리 땅임에도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완약하고 교활하게 거짓말로 길을 막고 있다."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회복하여 성과 보루를 쌓고 도로를 만든다면 어찌 거란과 교류를 하지 않겠는가?"

거란이 북쪽에 있고, 중간에 동여진이 있으며, 남쪽에 서경이 있다.
압록강은 오리 모양의 푸른실이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대릉하의 오리 모양이 바로 압록강이다.
동경유수 소손녕은 평평한 평야 지역으로 남하했다. - 고려군 기병 5000과 첫 전투를 치른다. (선봉장 윤서안)
소손녕이 안융진 점령에 실패한 이유는 거란군이 기병 중심의 군 편재이기 때문이다.
소손녕은 기병 8만으로는 공성전이 불리했기 때문에 서희와의 담판에 크개 만족한다.
- 동여진 지역은 산세가 험해 기병 중심의 요 동경 군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 고려가 대신 점령하여 거란에게 넘겨주면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기에 흔쾌히 싸인하고 퇴각 한 것.
이후 고려는 압록강 유역의 동여진 지역을 점령하여 강동 6주를 설치한다.
* 강동 6주 - 흥화진(興化鎭), 통주(通州), 구주(龜州), 곽주(郭州), 용주(龍州), 철주(鐵州)
"강동은 압록강 동쪽 지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압록강 동쪽에 강동 6주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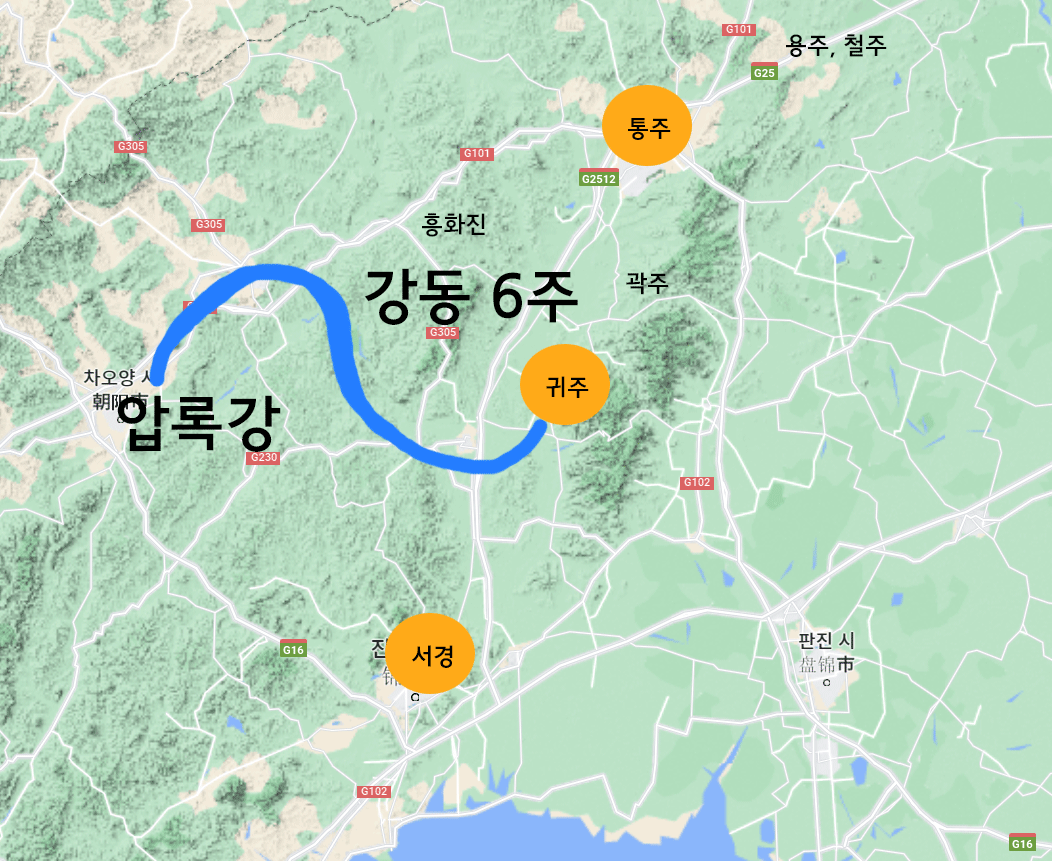
귀주는 해당 지역에 거북이 모양의 지형이 있기에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통주는 한자의 뜻이 종이란 뜻인데 푸신시 주변이 종 모양이다.
푸신시 주변은 2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 강조가 강에 진을 치고 기병 전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2) 2차 고려 거란 전쟁
1010년(현종 1년) 11월 요 성종은 4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공한다.
거란군은 흥화진을 공격하지만 성주 양규의 항전으로 함락하지 못한다.
현종은 강조를 행영도통사로 삼아 통주에서 막게 하지만 크게 패배했고 요 성종은 강조를 사로잡아 죽였다.
거란은 곽주, 안주 등의 성을 빼앗고, 개경을 함락시킨다.
고려 현종은 나주(羅州)로 피신한다.
요는 고려가 하공진(河拱辰)을 보내 현종이 친조한다는 조건으로 화친을 청하자 이를 받아들인다.
요는 회군 중에 구주 등에서 양규와 김숙흥(金叔興) 등의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양규와 김숙흥은 전사한다.

2차 고려 거란 전쟁은 고려의 전략적 실패로 패배한 것이다.
개경 방어 병력까지 모두 차출하여 통주로 보냈는데 통주 방어선이 무너지자 후방은 완전 고속도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전쟁은 고려의 완패였다.
거란군은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다 귀주와 흥화진 병력의 습격을 받았다.
(3) 3차 고려 거란 전쟁
1011년 정월 개경에 돌아온 현종은 요나라에 친조하지 않았다.
강동 6주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1013년 거란과 국교를 끊고 다음 해에 송나라와 다시 교류하였다.
요는 1018년 12월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으로 다시 고려를 침공하였다.
고려는 강감찬을 상원수,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20만 대군으로 이에 대비하였다.
흥화진 전투에서 고려는 1만 2천여 명의 기병을 산골짜기에 매복시켜 큰 승리를 얻었다.
거란은 고려군의 이어진 공격을 피하여 나아가다가 자주(慈州)에서 강민첨의 공격을 받았으며,
보급로가 불안해 식량 공급도 차질을 빚었다.
소배압은 다음 해 정월 개경에서 멀지 않은 신은현에 도달했으나 개경을 함락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군사를 돌려 퇴각하였다.
강감찬은 패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귀주(龜州)에서 적을 섬멸한다. 이 전투를 귀주대첩이라 한다.
거란군 10만 명 중에서 생존자는 겨우 2천여 명에 불과했다.

고려는 전면전이 아닌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투와 공성에 치중한다.
거란의 소배압은 고려의 병력 대부분이 국경에 배치된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고려 개경으로 직행하기로 결정한다.
산을 통하는 길은 무조건 기습을 받기 때문에 소배압은 가급적 넓은 길로 갔다.
그러다보니 서경 북쪽의 자주 지역을 통과해 개경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개경에는 많은 수의 고려군이 대기하고 있었다.
소배압은 10만 대군으로는 힘들다 싶어 퇴각을 결정한다.
고려는 소배압의 뒤를 쫒기 시작한다.
소배압은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간다.
평야 지역은 기병이 많은 거란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에 고려는 뒤만 슬슬 쫒을 뿐이었다.
귀주성 주변은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거란군은 강물을 연속으로 도하해야 했고, 이로인해 병력이 크게 세조각으로 분리되어 버린다.
고려는 이 순간을 노려 중앙에 있는 거란군을 공격했다.
거란의 중앙군은 강물에 막혀 퇴로가 막혀 있었고, 선두와 후위군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다.
거란군은 강 너머로 동료가 학살당하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학살이 끝나자 다음 상대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고려는 전방과 후위군을 차례로 공격하여 괴멸시킨다.
귀주대첩은 완벽한 포위 섬멸 작전의 지침서와 다름이 없다. (귀주대첩의 자세한 지형 설명은 전쟁사편에)